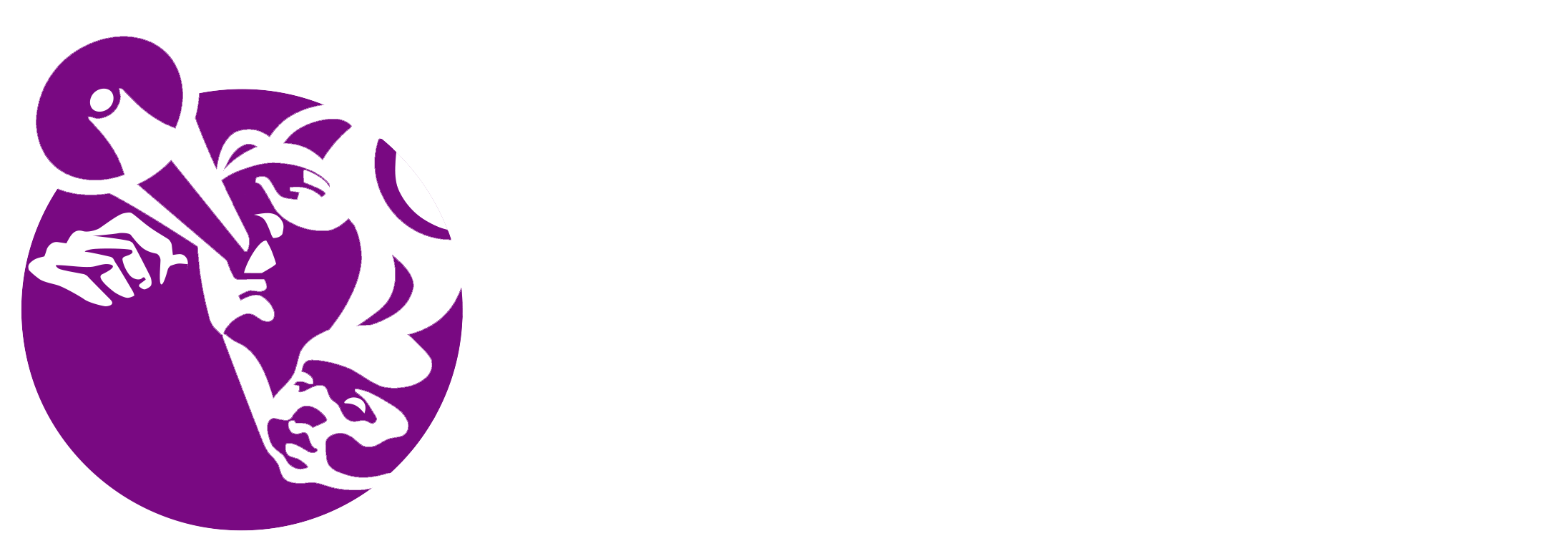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이번 스승의 날에도 지혜복 교사는 거리에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500일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외면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학생과 말벌 동지와 양육자와 노동자들이 지혜복 교사와 맞잡은 손은 오늘도 굳셉니다. "우리에게 지혜복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고통을 공론화하기 위해 과학자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통계적인 유의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학적 결과를 판단하는 데에는 노동자의 삶에 공감하는 태도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고통』 저자 캐런 매싱은 공감 없는 과학은 사람을 위한 과학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캐런 매싱은 자신이 노동자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30여년 간 “학자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이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공감 격차’로 명명하였다. 그 공감 격차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는 실천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깨운다.
2018년의 스쿨미투, 2025년 4월의 승소 판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는 뒤늦은 승소의 비애. 2018년 중·고등학생이었던 스쿨미투의 당사자들은 이제 만 20~25세의 성인이 됐으나 무려 8년이 지나는 동안 스쿨미투의 성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스쿨미투로 공론화된 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려 온 것처럼, 그들의 기억에서 스쿨미투가 잊히길 바란 것처럼, 학교와 교육청은 8년 동안 모두의 알권리를 빼앗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부터 스쿨미투 사안의 처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일 전 국민의 이목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됐을 때,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그러나 2018년 스쿨미투를 외쳤던 충북 지역 학생들에게, 지금은 어른이 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길이 없다. 정의를 지연시킴으로써 정의가 아니게 만든 충북교육청의 전략은 탁월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과 피해자 편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