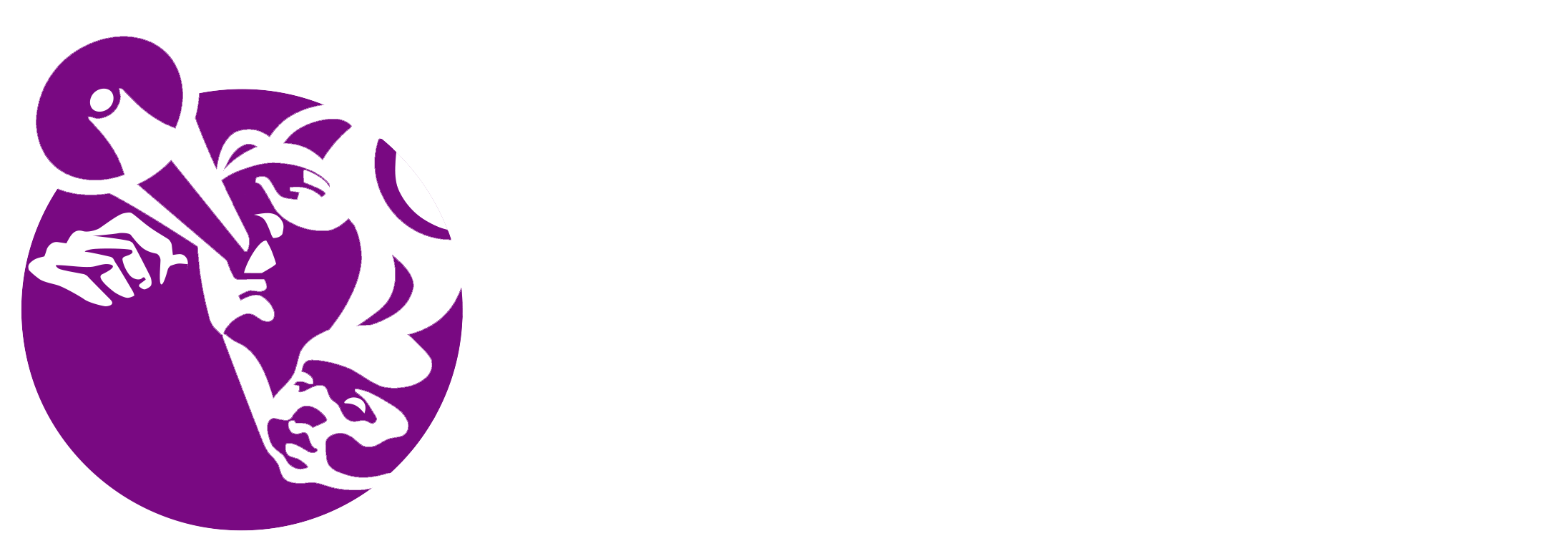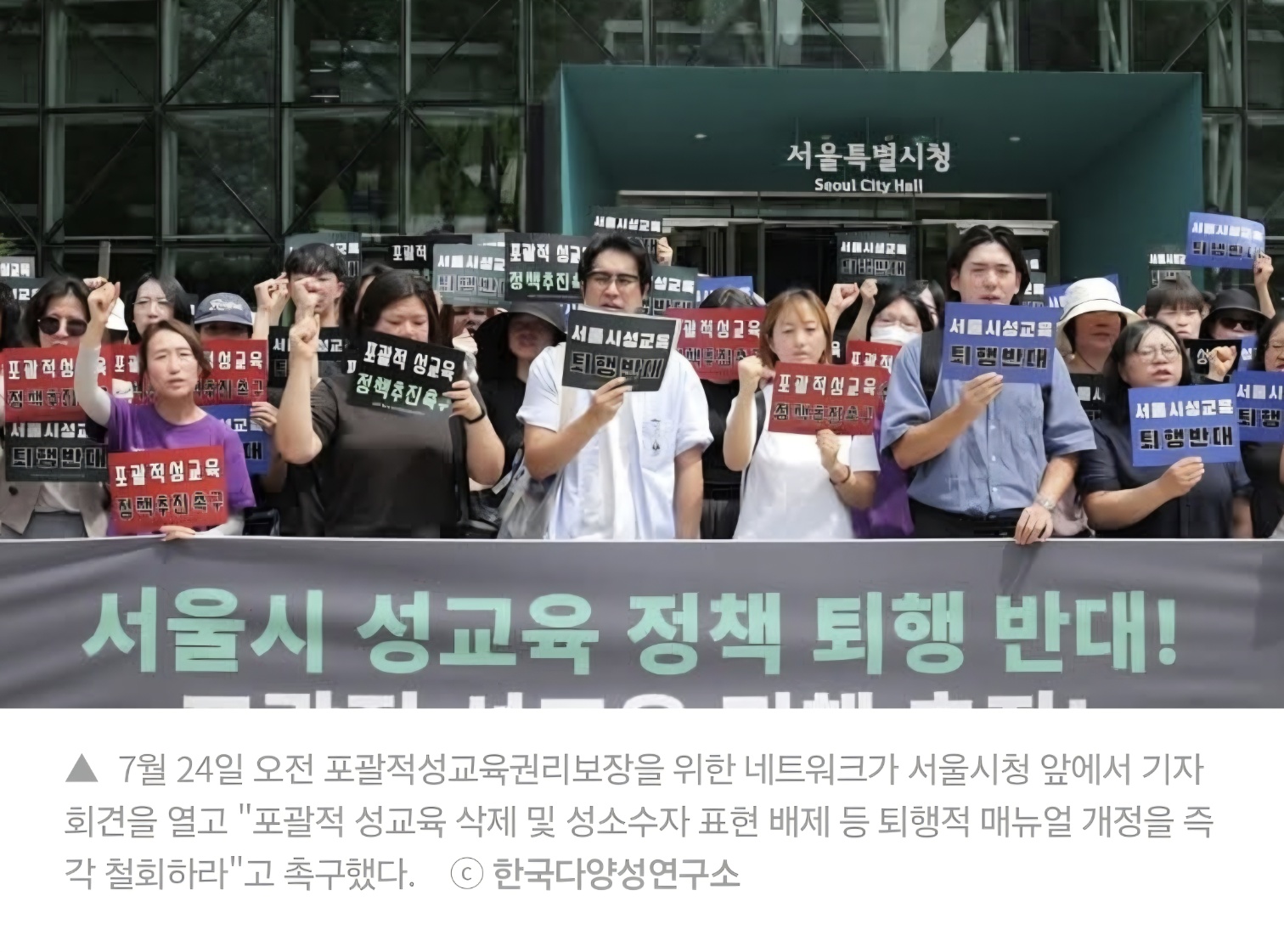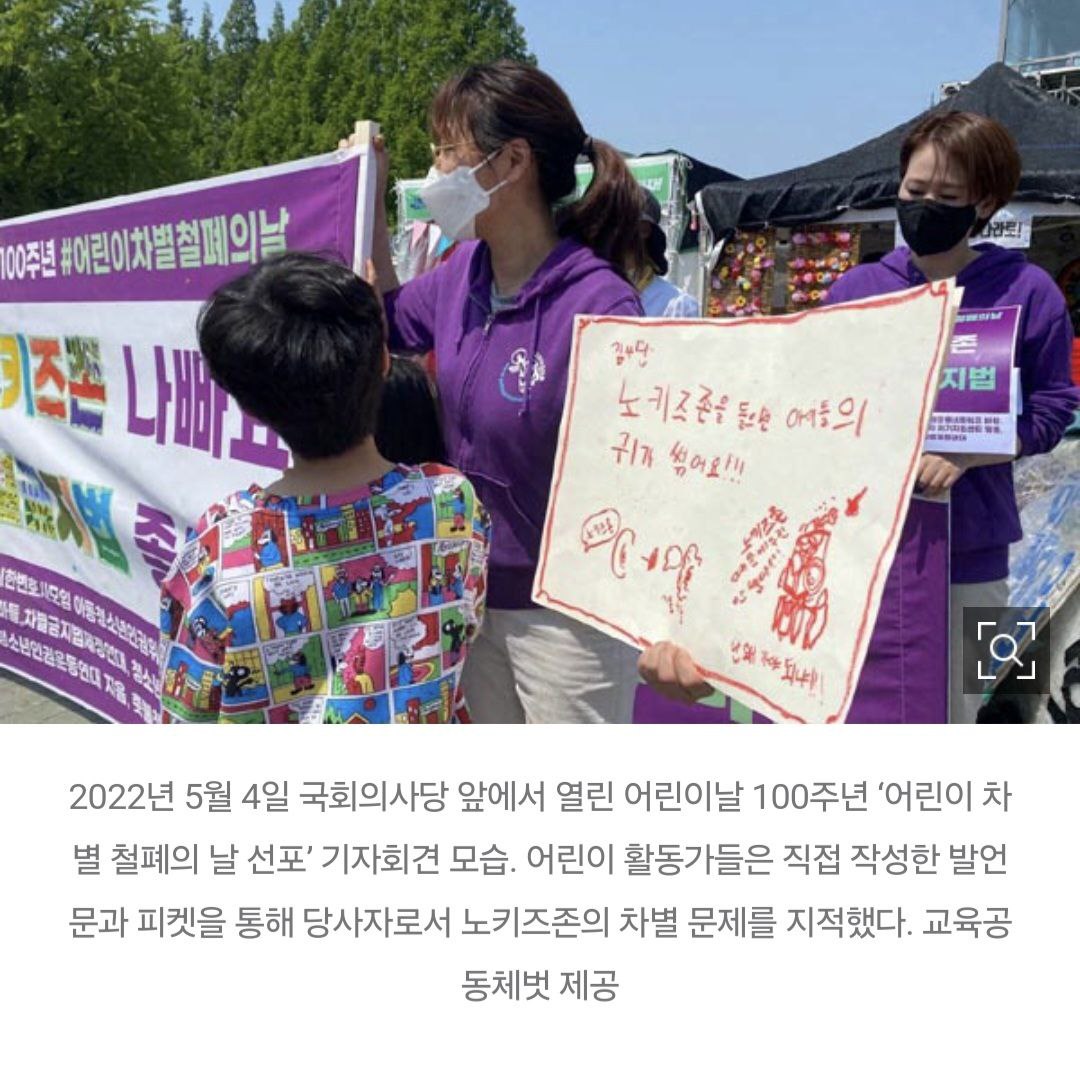홍어삼합을 주문했더니 묵은지만 나왔다. 홍어와 수육은 떨어졌단다. 괜찮다며 묵은지만 먹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홍어와 수육이 떨어졌는데 묵은지를 삼합이라고 내놓는 상인은 상도리는커녕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딱 그 꼴이다. 대입제도 개선 없는 고교학점제는 입시 지옥에 기름 뿌리는 격이다. 고교학점제는 3년간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대다수 고등학교가 8월 말~9월 초에 졸업할 때까지 수강할 교과목(174학점) 신청을 마감하고 있다. 1학년 때는 필수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공통과목(국·영·수·사·과·예체능 등)을 수강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학생 각자 신청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데 이 선택과목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고민을 시작해 보지도 못한 수많은 고1 학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선택과목을 수강 신청했다. 고1 재학생,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폭력이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다.